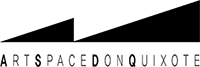|
[м§Җм—ӯм—°кө¬-мҲңмІң мӨ‘м•ҷлҸҷнҺё(1)] вҖӢ мӨ‘м•ҷлҸҷ, л•…мқҙлҰ„мқҳ ліҖмІңм—җ м–ҪнһҢ м—ӯмӮ¬В В В "мӨ‘м•ҷлҸҷмқҖ ліёлһҳ мҲңмІңкө° мҶҢм•Ҳл©ҙ м§Җм—ӯмңјлЎңм„ң 1914л…„ мқјм ңмқҳ н–үм •кө¬м—ӯ нҸҗн•©м—җ л”°лқј мҶҢм•Ҳл©ҙмқҳ лҸҷлӮҙлҰ¬мҷҖ лҸҷмҷёлҰ¬ мқјл¶ҖлҘј лі‘н•© лҢҖмҲҳм •мқҙлқј н•ҳкі , мҶҢм•Ҳл©ҙмқҳ лӮЁлӮҙлҰ¬мҷҖ лҸҷмҷёлҰ¬ мқјл¶ҖлҘј лі‘н•© ліём •, мҶҢм•Ҳл©ҙмқҳ лҸҷмҷёлҰ¬, мҡ°лӘ…лҰ¬ к°Ғ мқјл¶ҖлҘј лі‘н•© лҸҷмҷёлҰ¬лқј н•ҳм—¬ к°Ғк°Ғ мҲңмІңл©ҙм—җ нҺёмһ…лҗҳм—ҲлӢӨ. 1931л…„ 11мӣ” 1мқј лҢҖмҲҳм •, ліём •, лҸҷмҷёлҰ¬лҠ” мҲңмІңмқҚм—җ мҶҚн–Ҳмңјл©°, 1949л…„ 8мӣ” 15мқј м§Җл°©мһҗм№ҳм ң мӢңн–үм—җ л”°лқј мҲңмІңл¶Җк°Җ мҲңмІңмӢңлЎң л°”лҖҢкі лҸҷм ң мӢӨмӢңм—җ л”°лқј мӨ‘м•ҷлҸҷ, лӮЁлӮҙлҸҷ, лҸҷмҷёлҸҷмңјлЎң мҡҙмҳҒн•ҳлӢӨк°Җ 1964л…„ 1мӣ” 7мқј мҲңмІңмӢңмқҳ 33к°ңлҸҷмқ„ 16к°ң н–үм •мҡҙмҳҒлҸҷмңјлЎң мЎ°м •н•ҳл©ҙм„ң мӨ‘м•ҷлҸҷмқҙлқј н•ҳм—¬ нҳ„мһ¬м—җ мқҙлҘҙкі мһҲлӢӨ." (мҲңмІңмӢңмІӯ нҷҲнҺҳмқҙм§Җ)
мқҙкІғмқҖ мҲңмІңмӢң мӨ‘м•ҷлҸҷмқҳ м§ҖлӘ…мң лһҳлҘј м„ӨлӘ…н•ҳкі мһҲлҠ” нҳ„мһ¬ мӢңм җмқҳ кёҖмқҙлӢӨ. мқҙкІғмқ„ мўҖ лҚ” мқҙм•јкё°лЎң н’Җм–ҙлӮҙ ліјк№Ң н•ңлӢӨ. В мӨ‘м•ҷлҸҷ, м—¬лҹ¬ лҸ„мӢңм—җ вҖҳмӨ‘м•ҷлҸҷвҖҷмқҙ мһҲлӢӨ. мӨ‘м•ҷлҸҷмқҖ нҠ№нһҲ мғҒм—…мӢңм„Өмқҙ л°Җ집н•ң лҸ„мӢ¬мқҳ мӨ‘мӢ¬л¶ҖлҘј м§Җм№ӯн• л•Ң мӮ¬мҡ©лҗңлӢӨ. л”°лқјм„ң мқҙ м§Җм—ӯмқҖ мғҒк°Җк°Җ л°ңлӢ¬н•ҙ мһҲкі мң лҸҷ мқёкө¬к°Җ л§ҺмқҖ кІғмқҙ нҠ№м§•мқҙлӢӨ. мҲңмІңмӢң мӨ‘м•ҷлҸҷмқҖ мҲңмІң мӣҗлҸ„мӢ¬мқҳ мӨ‘мӢ¬мқҙлқј н• мҲҳ мһҲлӢӨ. лҸ„мӢңк°Җ нҷ•мһҘлҗЁм—җ л”°лқј к·ё мӨ‘мӢ¬мқҙ мқҙлҸҷн–Ҳкұ°лӮҳ лӢӨмӣҗнҷ”лҗҳм—Ҳм§Җл§Ң, м—¬м „нһҲ мӨ‘м•ҷлҸҷмқё кІғмқҙлӢӨ. нҳ„мһ¬мқҳ мӨ‘м•ҷлҸҷмқ„ вҖҳмӣҗмӨ‘м•ҷлҸҷвҖҷмқҙлӮҳ вҖҳкө¬мӨ‘м•ҷлҸҷвҖҷмңјлЎң л¶ҖлҘҙм§Җ м•ҠлҠ” мқҙмң лҠ” н–үм •м Ғ кҙҖмҠө лҳҗлҠ” кҙҖлЎҖлқј н• мҲҳ мһҲкІ мңјлӮҳ, вҖҳмӨ‘м•ҷвҖҷмқҙлқјлҠ” л§җмқҙ м§ҖлӢҢ мғҒ징м Ғ мң„мғҒмқ„ к·ёлҢҖлЎң кі мҲҳн•ҳкі мӢ¶мқҖ мЈјлҜјл“Өмқҳ мӢ¬лҰ¬лҸ„ мһ‘мҡ©н•ҳкі мһҲмқ„ кІғмқҙлӢӨ. мӨ‘м•ҷлҸҷ мӮ¬лһҢл“Өм—җкІҢлҠ” мқјмў…мқҳ мһҗмЎҙмӢ¬мқҙ кұёлҰ° мқҙлҰ„мқҙ лҗҳм–ҙ лІ„л ёлӢӨ. к·ёлҹ° л©ҙм—җм„ң мҲңмІңмқҳ мһҗмЎҙмӢ¬мқҖ мӨ‘м•ҷлҸҷм—җ мһҲлӢӨкі н•ҙлҸ„ м§ҖлӮҳм№ҳм§Җ м•ҠлӢӨ. кіјкұ°мқҳ мҳҒнҷ”лҘј л¶ҖнҷңмӢңнӮӨл ӨлҠ” л…ёл ҘмқҖ кі„мҶҚлҗҳкі мһҲлӢӨ.В В мң„мқҳ м„ӨлӘ…м—җм„ң м•Ң мҲҳ мһҲл“Ҝ вҖҳмӨ‘м•ҷлҸҷвҖҷмқҙлқјлҠ” м§ҖлӘ…мқҖ н•ҙл°© мқҙнӣ„ мқјм ңк°•м җкё°м—җ мӮ¬мҡ©лҗҳм—ҲлҚҳ м§ҖлӘ…мқ„ л°”кҫёл©ҙм„ң мғҲлЎӯкІҢ л“ұмһҘн•ҳкІҢ лҗңлӢӨ. мқјм ңк°•м җкё°м—җ вҖҳлҢҖмҲҳм •(еӨ§жүӢз”ә, мҳӨн…Ңл§Ҳм№ҳ)вҖҷмқҙ мҳӨлҠҳмқҳ мӨ‘м•ҷлҸҷмқҙ лҗҳм—ҲлӢӨ. мҲңмІң н–үлҸҷкіј мҳҒлҸҷмқҖ мқјліёмӢқ м •(з”ә)мқ„ лҸҷ(жҙһ)мңјлЎң л°”кҫём—Ҳмқ„ лҝҗ мқҙлҰ„мқҖ к·ёлҢҖлЎң мӮ¬мҡ©н•ң кІҪмҡ°мқҙлӢӨ. лӮҳлЁём§Җ м§Җм—ӯмқҖ лҰ¬(йҮҢ)к°Җ лҸҷмңјлЎң л°”лҖҢм—ҲлӢӨ.В лҢҖмҲҳм •мқҙ мқҙм „мқҳ вҖҳлҸҷлӮҙлҰ¬вҖҷмҷҖ вҖҳлҸҷмҷёлҰ¬вҖҷ мқјл¶ҖлҘј лі‘н•©н–ҲлӢӨкі н•ң кІғмқҖ кіјкұ° мҲңмІңл¶ҖмқҚм„ұмқҳ м„ұлІҪмқ„ кё°мӨҖмңјлЎң м„ұм•Ҳкіј м„ұл°–мқҙлқјлҠ” кө¬л¶„мқҙ мһҲм—Ҳкі , м„ұм•ҲмқҖ лӢӨмӢң лҸҷм„ңлӮЁл¶Ғ л„Ө к°ңмқҳ л¬ёмңјлЎңм„ң лҸҷлӮҙлҰ¬, л¶ҒлӮҙлҰ¬, м„ңлӮҙлҰ¬, лӮЁлӮҙлҰ¬мқҳ л„Ө кө¬м—ӯмңјлЎң лӮҳлүҳм—ҲлӢӨ. лІ•м •лҸҷмқё мӨ‘м•ҷлҸҷ, лӮЁлӮҙлҸҷ, лҸҷмҷёлҸҷ м„ё лҸҷлӘ…мқҳ ліҖнҷ” кіјм •мқ„ м •лҰ¬н•ҳл©ҙ лӢӨмқҢкіј к°ҷлӢӨ. (м°ёмЎ° м§ҖлҸ„1) В (1) мҶҢм•Ҳл©ҙ лҸҷлӮҙлҰ¬мҷҖ лҸҷмҷёлҰ¬ мқјл¶ҖвҶ’лҢҖмҲҳм •вҶ’мӨ‘м•ҷлҸҷ (2) мҶҢм•Ҳл©ҙ лӮЁлӮҙлҰ¬мҷҖ лҸҷмҷёлҰ¬ мқјл¶ҖвҶ’ліём •вҶ’лӮЁлӮҙлҸҷ (3) мҶҢм•Ҳл©ҙ лҸҷмҷёлҰ¬мҷҖ мҡ°лӘ…лҰ¬ мқјл¶ҖвҶ’лҸҷмҷёлҰ¬вҶ’лҸҷмҷёлҸҷ В В
В В [м§ҖлҸ„1] 1915л…„ мқјм ңк°•м җкё° мҲңмІңкө° м§Җм ҒлҸ„ мқјл¶ҖвҖӢ
к°қмӮ¬к°Җ мһҲм—ҲлҚҳ кіі, мӨ‘м•ҷлҸҷ В вҖҳнҒ° мҶҗвҖҷмңјлЎң н’ҖмқҙлҗҳлҠ” лҢҖмҲҳ(еӨ§жүӢ)лҠ” м–ҙл–Ө мқҳлҜёлҘј м§ҖлӢҢ м§ҖлӘ…мқјк№Ң? нҒ° мҶҗмңјлЎң м№ҳмһҗл©ҙ л¶ҖмІҳлӢҳ мҶҗл°”лӢҘл§Ң н•ң кІғмқҙ м—ҶлҠ”лҚ°, мқјліёмқёл“Өмқҙ ліҙкё°м—җ мҲңмІңм—җм„ң л¶ҖмІҳлӢҳ мҶҗл°”лӢҘмқҙ м§ҖкёҲмқҳ мӨ‘м•ҷлҸҷмқҙм—Ҳмқ„к№Ң? вҖҳнҷ©кёҲвҖҷмқҙлқјлҠ” л§җлҸ„ к·ёл Үкұ°лӢҲмҷҖ, кёҲл¶ҖмІҳмқҳ мҶҗл°”лӢҘ, к·ёкІғмқҙ лҢҖмҲҳм •мқҙ к°Җ진 мқҳлҜёмқјм§ҖлҸ„ лӘЁлҘёлӢӨ. мқјліём–ҙ мҳӨн…Ң(еӨ§жүӢ, гҒҠгҒҠгҒҰ)лҠ” м„ұ(жҲҗ)мқҳ м •л©ҙ лҳҗлҠ” м •л¬ёмқ„ мқҳлҜён•ңлӢӨкі н•ңлӢӨ. м„ұмқҳ м •л¬ёмқҙлһҖ кі§ м„ұмқҳ мӨ‘мӢ¬л¶ҖлЎң 진мһ…н•ҳлҠ” кҙҖл¬ёмқ„ л§җн•ңлӢӨ. мҳҲл¶Җн„° мҲңмІңмқҚм„ұмқҳ м •л¬ёмқҖ мқјл°ҳм ҒмңјлЎң лӮЁл¬ёмңјлЎң м—¬кІЁмЎҢлӢӨ. 진лӮЁ(йҺӯеҚ—)мқҳ мқҳлҜёлҸ„ мһҲкұ°лӢҲмҷҖ мҳҘмІңліҖм—җ мһҗлҰ¬ мһЎмқҖ лӮЁл¬ёмқҳ лҲ„к°Ғмқё м—°мһҗлЈЁ(зҮ•еӯҗжЁ“)к°Җ к·ё мқҙлҰ„мІҳлҹј вҖҳмҶҢк°•лӮЁ(е°ҸжұҹеҚ—)вҖҷ мҲңмІңмқ„ мғҒ징н•ҳкё°лҸ„ н–ҲлӢӨ. к·ёлҹ¬лӮҳ мқјліёмқёмқҳ мғқк°ҒмқҖ лӢ¬лһҗлҚҳ кІғмңјлЎң ліҙмқёлӢӨ. мқјліёмқёмқҖ к·ёл“Өмқҳ к№ғл°ңмІҳлҹј н•ҙк°Җ лңЁлҠ” лҸҷмӘҪмқ„ мҲӯмғҒн•ҳмҳҖкі , м•„л§ҲлҸ„ кіјкұ° м •мң мһ¬лһҖ лӢ№мӢң кө°лҢҖлҘј мқҙлҒҢкі мҲңмІңмқ„ 진мһ…н•ң мІ« л¬ёмқҙ лҸҷл¬ёмқҙм—Ҳмқ„ кІғмқҙкё°м—җ лҸҷл¬ёмқ„ мҲңмІңм„ұмқҳ м •л¬ёмңјлЎң мқёмӢқн–ҲлҚҳ кІғмқҙ м•„лӢҗк№Ң?В лҚ”кө°лӢӨлӮҳ лҸҷл¬ёмқҖ мЎ°м„ мҷ•мқҳ мң„нҢЁлҘј лӘЁмӢ к°қмӮ¬(е®ўиҲҚ)мҷҖ к°Җк№Ңмӣ лӢӨ. л•Ңл¬ём—җ лҢҖмҲҳм •мқҙлқјлҠ” м§ҖлӘ…мқҙ лҸҷл¬ёкіј к°қмӮ¬лқјлҠ” л‘җ к°ңмқҳ мғҒ징м Ғ кұҙ축물м—җ мқҳн•ҙ нҳ•м„ұлҗҳм—Ҳмқ„ кІғмқҙлқјкі м¶”лЎ н• мҲҳ мһҲлӢӨ. лҢҖмҲҳм •мқҖ лҳҗн•ң, мқјмў…мқҳ нҷ©кёҲмқ„ лӮілҠ” н•өмӢ¬ мғҒк¶Ң м§Җм—ӯмңјлЎңм„ң лҢҖмҲҳм • к¶Ңм—ӯмқ„ мқјліёмқёл“Өмқҳ ліёкұ°м§Җмқё ліём •(жң¬з”ә)-лӮЁлӮҙлҸҷм—җм„ң л»—м–ҙ лӮҳмҳЁ л¶ҖмІҳмқҳ нҢ”кіј мҶҗл°”лӢҘмңјлЎң мғқк°Ғн–Ҳмқ„ мҲҳ мһҲлӢӨ.В мҲңмІңл¶ҖмқҚм„ұмқҳ лҸҷл¬ёмқҖ мһ„кёҲмқҳ лӘ…мқ„ л°ӣкі мҲңмІңл¶ҖмӮ¬лЎң л¶Җмһ„н•ҙмҳЁ м§Җл°©кҙҖмқҙ л“Өм–ҙмҳӨкі лӮҳк°ҖлҠ” кҙҖл¬ёмқҙм—ҲлӢӨ. м§Җм—ӯлҜјл“ӨмқҖ к·ёл“Өмқ„ л§һмқҙн•ҳкі л– лӮҳліҙлӮҙлҠ” мһҘмҶҢмҳҖлӢӨ. мҲңмІңм—җм„ң н•ңм–‘(м„ңмҡё)мңјлЎң к°ҖлҠ” нҒ°кёёмқҖ л¶Ғл¬ёмқҙ м•„лӢҢ лҸҷл¬ём—җм„ң мӢңмһ‘лҗҳм—ҲлӢӨ. м—¬мҲҳмҷҖ кҙ‘м–‘мңјлЎң к°ҖлҠ” кёё лҳҗн•ң лҸҷл¬ёмқ„ нҶөн•ҙм„ңмҳҖлӢӨ. мҲңмІңмқ„ кұ°міҗ к°„ мҲҳл§ҺмқҖ м—ӯлҢҖ м§Җл°©кҙҖл“Өмқҳ лӘЁмҠөмқҙ лҸҷл¬ёкёёкіј лҸҷл¬ё л°–м—җм„ң м–ҙлҘёкұ°лҰ°лӢӨ. кі л ӨмЎ° нҢ”л§Ҳ비мқҳ мЈјмқёкіө мөңм„қ л¶ҖмӮ¬лҸ„, мЎ°м„ мЎ° мҲңмІңм—җм„ң мҠ№нҸүм„ёмғҒмқ„ кҝҲкҝЁлҚҳ м§Җлҙү мқҙмҲҳкҙ‘лҸ„ лҸҷл¬ёмңјлЎң л“Өм–ҙмҷҖ лҸҷл¬ёмқ„ л№ м ёлӮҳк°”мқ„ кІғмқҙлӢӨ. к·ёл“Ө лӘЁл‘җм—җкІҢ мҲңмІңмқҖ м–ҙл–Ө мІ«мқёмғҒкіј мҶҢнҡҢлҘј лӮЁкІјмқ„к№Ң?В мқҙмІҳлҹј лҸҷл¬ёмқҖ мҲңмІңл¶ҖмқҚм„ұмқҳ л„Ө л¬ё к°ҖмҡҙлҚ° лӮЁл¬ёл§ҢнҒј мӨ‘мҡ”н–Ҳкі л§Ңк°җмқҙ көҗм°Ён–Ҳмқ„ л¬ёмқҙм—ҲлӢӨ. к·ёлҹ° лҸҷл¬ёмқҙ 1909л…„ л¬ҙл ө лҸ„лЎңлҘј к°ңм„Өн•ңлӢӨлҠ” мқҙмң лЎң к°ҖмһҘ лЁјм Җ н—җл ёлӢӨ. к·ёлҰ¬кі мһҠнҳҖмЎҢлӢӨ. л§Ңм•Ҫ мӨ‘м•ҷлҸҷмқҳ м—ӯмӮ¬м Ғ кІҪкҙҖмқҳ мһ¬мғқмқҙ н•„мҡ”н•ҳлӢӨл©ҙ к°қмӮ¬мҷҖ лҸҷл¬ёмқ„ м–ҙл–»кІҢ кё°м–өн•ҳкі лӢӨмӢң кё°лЎқн• м§Җ мғқк°Ғн•ҙліј мқјмқҙлӢӨ. л¶Җм—°н•ҳмһҗл©ҙ, лҸҷл¬ёмқ„ кҙҖнҶөн•ҳлҠ” кёёмқ„ нҳ„мһ¬ лӮЁл¬ё м—°мһҗлЈЁмқҳ мқҙлҰ„мқ„ л№Ңл Ө вҖҳм—°мһҗлЎңвҖҷлЎң л¶ҖлҘҙкі мһҲлҠ”лҚ° вҖҳлҸҷл¬ёлЎңвҖҷлЎң лӘ…лӘ…н•ҙм•ј л§һлӢӨ.В В мӨ‘м•ҷмӢңмһҘкіј лӮЁлӮҙлҸҷ В лӮЁлӮҙлҸҷмқҖ вҖҳлӮЁл¬ём•ҲвҖҷмңјлЎң л¶Ҳл ҖлҚҳ кІғмқҙ, мқјм ңк°•м җкё°м—җ ліём •(жң¬з”ә)мңјлЎң л°”лҖҢм—ҲлӢӨ. л§Ҳм№ҳ ліён–Ҙ(жң¬й„•)мқҙлқјлҠ” мқҳлҜёлЎң лӢӨк°ҖмҳЁлӢӨ. к·ё мқҙлҰ„мІҳлҹј мҲңмІң м§Җм—ӯм—җ мқҙмЈјн•ҙмҳЁ мқјліёмқёмқҙ мқјм°Қл¶Җн„° мһҗлҰ¬ мһЎмқҖ м§Җм—ӯмқҙлӢӨ. ліём •мқҖ мқјліём–ҙлЎң вҖҳнҳјл§Ҳм№ҳвҖҷлқј л¶ҖлҘёлӢӨ. мҲңмІңл¶ҖмқҚм„ұмқҳ м„ұлІҪ к°ҖмҡҙлҚ° к°ҖмһҘ лЁјм Җ н—җлҰ° кө¬к°„мқҙ лӮЁлӮҙмқҳ м„ұлІҪмңјлЎң лӮЁл¬ёкіј лҸҷл¬ё мӮ¬мқҙ кө¬к°„мқҙлӢӨ. кҙ‘мЈјмҷҖ м—°кІ°лҗҳлҠ” мӢ мһ‘лЎңлҘј к°ңм„Өн•ҳкё° мң„н•ҙ л¶Ғл¬ё мҳҶ м„ұлІҪ мқјл¶Җ분мқ„ н—җм—ҲлҚҳ кІғкіј 비көҗн•ҳмһҗл©ҙ лӮЁлӮҙ м§Җм—ӯм—җм„ңлҠ” кёҙ м„ұлІҪ м „мІҙлҘј л¬ҙл„ҲлңЁл ёлӢӨ. м„ұлІҪмқҙ мӮ¬лқјм§„ мһҗлҰ¬лҠ” лҸ„лЎңк°Җ лҗҳм—Ҳкі к·ё мЈјліҖмңјлЎң мғҒк°ҖмҷҖ мЈјнғқмқҙ л“Өм–ҙм„°лӢӨ. к·ёмӨ‘ лӮЁл¬ё мҳҘмІңліҖмқҙ нҳ„мһ¬мқҳ мӨ‘м•ҷмӢңмһҘкёёмқҙ лҗҳм—ҲлӢӨ. мӣҗлһҳ мһҘмқҖ л¶ҖлӮҙмһҘ(еәңе…§е ҙ)мқҙлқј н•ҳм—¬ лӮЁл¬ёкіј лҸҷл¬ёкұ°лҰ¬лҘј мӨ‘мӢ¬мңјлЎң 5мқјмһҘмқҙ м„°лӢӨ. [лҸ„нҢҗ1]кіј к°ҷмқҙ мһҘлӮ мқҙл©ҙ л¬јкұҙмқ„ мӮ¬кі нҢ”кё° мң„н•ҙ лӘЁм—¬л“ мӮ¬лһҢл“ӨлЎң мӢңлӮҙлҠ” мқёмӮ°мқён•ҙлҘј мқҙлЈЁм—ҲлӢӨ. мқјм ңлҠ” 20л…„лҢҖ мӨ‘нӣ„л°ҳм—җ лҸ„мӢ¬ нҳјмһЎмқ„ мқҙмң лЎң м„ұ м•Ҳм—җ м—ҙл ёлҚҳ мһҘмқ„ м„ұ л°–мңјлЎң мҳ®кІјлҠ”лҚ°, к·ёкІғмқҙ м§ҖкёҲмқҳ л¶Ғл¶ҒмӢңмһҘ(мӣғмһҘ)мқҙ лҗҳм—Ҳкі мқјл¶Җ м–ҙмӢңмһҘмқҙ лӮЁм•„ нҳ„ мӨ‘м•ҷмӢңмһҘмқҙ лҗң кІғмқҙлӢӨ. мӨ‘м•ҷмӢңмһҘмңјлЎң лӮЁмқ„ мҲҳ мһҲм—ҲлҚҳ мқҙмң лҸ„ мқјліёмқё кұ°лҘҳм§Җк°Җ лӮЁлӮҙм—җ мЈјлЎң нҳ•м„ұлҗҳм—ҲмңјлҜҖлЎң, мқјліёмқёмқҳ нҺёмқҳлҘј кі л Өн•ҳмҳҖлҚҳ кІғмқҙлқј ліј мҲҳ мһҲлӢӨ. мЎ°м„ мқёмқҙ мһҘм•…н–ҲлҚҳ мӢңлӮҙ м җнҸ¬лҠ” м„ңм„ңнһҲ мқјліёмқё мӮ¬мһҘмңјлЎң көҗмІҙлҗҳкё° мӢңмһ‘н–ҲлӢӨ. к·ёлҹ¬л©ҙм„ң ліём •мқҳ мғҒк¶ҢмқҖ м җм°Ё лҢҖмҲҳм •мңјлЎң нҷ•лҢҖлҗҳм—ҲлӢӨ. л„ҲлҘё к°қмӮ¬ н„°лҘј мҲҳмҡ©н•ң нӣ„ лҢҖм§ҖлҘј мһҳкІҢ лӮҳлҲ„м–ҙ лҜјк°„м—җ 분양н–ҲлӢӨ. м•„мқҙл“Өмқ„ к°ҖлҘҙміӨлҚҳ н•ҷкөҗлЎң мӮ¬мҡ©н–ҲлҚҳ к°қмӮ¬лҠ” к·ёл ҮкІҢ мҷ„м „нһҲ мӮ¬лқјм§Җкі л§җм•ҳлӢӨ.В мЎ°м„ мқ„ мӢқлҜјм§Җнҷ”н•ң мқјліёмқёл“ӨмқҖ м№ҳм•Ҳмқ„ мқҙмң лЎң мЎ°м„ мқё кұ°мЈјм§ҖмҷҖ ліҙмқҙм§Җ м•ҠлҠ” кІҪкі„лҘј л§Ңл“Өм–ҙ к°”лӢӨ. мҲңмІңм—җм„ң мқјліёмқёл“ӨмқҖ лҸҷл¬ё к·јмІҳ кІҪм°°м„ңмҷҖ мӨ‘м•ҷмӢңмһҘмқҙ к°Җк№қкі м„ұлІҪмқ„ н—җм–ҙлІ„лҰ° мқҙнӣ„лЎң 비көҗм Ғ көӯмң м§Җ лҳҗлҠ” кіөм§Җк°Җ л§Һм•ҳлҚҳ лӮЁлӮҙмҷҖ м„ұлҸҷ м§Җм—ӯм—җ л°Җ집 кұ°мЈјн•ҳмҳҖлҚҳ кІғмңјлЎң ліҙмқёлӢӨ. нҳ„ м„ұлҸҷмҙҲл“ұн•ҷкөҗ м—ӯмӢң мқјліёмқё мһҗл…Җ көҗмңЎмқ„ мң„н•ң мҶҢн•ҷкөҗлЎң кё°мЎҙ мҳҒлҸҷм—җм„ң 1932л…„ л¬ҙл өм—җ нҳ„мһ¬мқҳ лҸҷмҷё м§Җм—ӯмңјлЎң көҗмӮ¬лҘј мғҲлЎң м§Җм–ҙ мҳ®кІјлҚҳ кІғмқҙлӮҳ, лҸҷл¬ё л°– лҸҷмІң ліҖм—җ мһҗлҰ¬ мһЎкі мһҲлҚҳ нҷҳм„ м • нҳёмҲҳлҘј л©”мӣҢ мӢңлҜј кіөмӣҗмңјлЎң л§Ңл“Өл Өкі н–ҲлҚҳ м җмңјлЎң лҜёлЈЁм–ҙ ліҙл©ҙ мқҙ м§Җм—ӯ мқјлҢҖк°Җ мқјліёмқёмқҳ ліё мЈјкұ°м§ҖмҳҖкі , м җм җ мқјліёмқём—җ мқҳн•ң, к·ёл“Өмқ„ мң„н•ң к°ңл°ңмқҙ нҷңл°ңн–Ҳмқ„ кІғмңјлЎң м§җмһ‘н• мҲҳ мһҲлӢӨ. В В [лҸ„нҢҗ1] 1910~1920л…„лҢҖ мҙҲл°ҳ м¶”м •. мҲңмІңл¶ҖлӮҙмһҘ мһҘлӮ н’ҚкІҪ. лҜёкөӯм„ көҗмӮ¬к°Җ лӮЁл¬ё м—°мһҗлЈЁ мң„м—җ мҳ¬лқј мҙ¬мҳҒн•ң кІғмңјлЎң нҳ„ мӨ‘м•ҷлЎңмқҳ лӘЁмҠөмқҙлӢӨ. л©ҖлҰ¬ л¶ҒмӘҪмңјлЎң к°қмӮ¬мқҳ мӣ…мһҘн•ң нҢ”мһ‘м§Җ붕과 мҡ°мёЎ л’ӨлЎң мӮјмӮ°мқҳ мқјл¶Җк°Җ ліҙмқёлӢӨ.вҖӢ В В В лҸҷл¬ё л°– лҸҷмҷёлҸҷ В вҖҳлҸҷмҷёвҖҷлҠ” вҖҳлҸҷл¬ё л°–вҖҷмқ„ лң»н•ңлӢӨ. мЎ°м„ мӢңлҢҖм—җлҠ” лҸҷл¬ёмқ„ кё°мӨҖмңјлЎң вҖҳлҸҷл¬ём•Ҳ(лҸҷлӮҙлҰ¬)вҖҷкіј вҖҳлҸҷл°–м—җ(лҸҷмҷёлҰ¬)вҖҷлЎң л¶Ҳл ҖлӢӨ. к·ёл°–м—җ 1872л…„ кі мў… 9л…„м—җ м ңмһ‘лҗң мҲңмІң м§ҖлҸ„м—җм„ңлҠ” лҸҷмҷё м§Җм—ӯм—җ вҖҳмӮ¬м •(е°„дёҒ)вҖҷкіј вҖҳмӮ¬л§Ҳ(еҸёйҰ¬)вҖҷлқјлҠ” л‘җ м§ҖлӘ…кіј н•Ёк»ҳ мӢ м„ мқ„ л¶ҖлҘҙлҠ” кіімқҙм—ҲлҚҳ нҷҳм„ м •(е–ҡд»ҷдәӯ)мқҙлқјлҠ” нҳёмҲҳлҘј м°ҫм•„ліј мҲҳ мһҲлӢӨ. мқҙ м§ҖлӘ…м—җ лҢҖн•ҙм„ңлҠ” вҖңл‘җ лІҲм§ё мқҙм•јкё°вҖқм—җм„ң лӢӨлЈ° кІғмқҙлӢӨ. лҸҷмҷёлҸҷ мқјл¶Җ분мқҙ лҗң мҡ°лӘ…лҰ¬лҠ” нҳ„ л§ӨкіЎлҸҷ мҡ°лӘ…л§Ҳмқ„мқҳ мҳӣ м§ҖлӘ…мңјлЎң к·ё мқјл¶Җк°Җ лҸҷмҷёлҸҷм—җ нҸ¬н•Ёлҗң л“Ҝн•ҳлӢӨ. кіјкұ°л¶Җн„° вҖҳм„ұм•ҲвҖҷкіј вҖҳм„ұл°–вҖҷмқҙлқјлҠ” л‘җ к°ңмқҳ м§Җм—ӯ кө¬л¶„мқҙ мҳӨлһ«лҸҷм•Ҳ лҝҢлҰ¬лӮҙлҰ¬кі мһҲм—ҲлӢӨ. н•ңм–‘м—җм„ңлҸ„ мӮ¬лҢҖл¬ё м•Ҳкіј л°–мқҙ кө¬лі„лҗҳм—ҲлӢӨ. лӢӨл§Ң мқҙ кө¬л¶„мқҙ лӢӨмҶҢ м°Ёлі„лЎң лӮҳнғҖлӮҳкё°лҸ„ н–ҲлҚҳ лӘЁм–‘мқҙлӢӨ. м„ұл°–мқ„ м„ұм Җ(еҹҺеә•-м„ұлІҪ м•„лһҳ) лҳҗлҠ” көҗмҷё(йғҠеӨ–)лқј н•ҳм—¬ лӮ®м¶° л¶ҖлҘҙкұ°лӮҳ кҙҖмӢ¬ л°–мңјлЎң л‘җм—ҲлҚҳ кІғмқҙлӢӨ. к·ёлҹ¬лӮҳ лҸ„м„ұмқҙ м•„лӢҢ м§Җл°© мқҚм„ұмқҳ к·ңлӘЁлЎң ліј л•Ң, м„ұм•ҲмқҖ мЈјлЎң кҙҖмІӯмқҙ н•өмӢ¬мқ„ м°Ём§Җн•ҳмҳҖкі лҜјк°ҖлҸ„ мқјл¶Җ мһҲм—Ҳм§Җл§Ң, лҢҖл¶Җ분мқҳ лҜјк°ҖмҷҖ мҙҢлқҪмқҳ л°ұм„ұл“Өмқҙ м„ұл°–м—җм„ң мӮҙм•ҳлӢӨ. к·ёлҝҗл§Ң м•„лӢҲлқј мң көҗмқҳ м •мӢ м Ғ м„ұм „мқҙлқј н• мҲҳ мһҲлҠ” л¬ёл¬ҳмқё н–Ҙкөҗ, мӮ¬м§ҒлӢЁ(зӨҫзЁ·еЈҮ), м—¬лӢЁ(еҺІеЈҮ), м„ұнҷ©лӢЁ(еҹҺйҡҚеЈҮ)кіј к°ҷмқҖ мғҒ징м Ғ м ңмӮ¬ мӢңм„Өмқҙ м„ұл°–м—җ мһҗлҰ¬ мһЎкі мһҲм—ҲмңјлҜҖлЎң м„ұм•Ҳл§Ң ліҙм•„м„ңлҠ” кіјкұ°мқҳ м „нҶөлҸ„мӢңмқё мқҚм„ұмқҳ кө¬мЎ°лӮҳ мҳӣмӮ¬лһҢл“Өмқҳ мӮ¶мқҳ кіөк°„мқ„ мқҙн•ҙн–ҲлӢӨкі н• мҲҳ м—ҶлӢӨ. к·ёлҹ¬лҜҖлЎң м„ұл°–мқ„ м„ұм•Ҳкіј н•Ёк»ҳ м ңлҢҖлЎң мӮҙнҺҙм•ј 비лЎңмҶҢ мӣҗлҸ„мӢ¬мқҳ кіөк°„м Ғ м—ӯмӮ¬м„ұмқ„ мқҙн•ҙн• мҲҳ мһҲлӢӨкі н•ҳкІ лӢӨ. мӨ‘м•ҷлҸҷмқҳ лҸҷмҷё м§Җм—ӯмқҙ к·ёл ҮлӢӨ. мҡ°лҰ¬лҠ” лҸҷмҷёлҸҷмқҳ м—ӯмӮ¬м Ғ мһҘмҶҢм„ұм—җ лҢҖн•ҙ м–јл§ҲлӮҳ м•Ңкі мһҲмқ„к№Ң? лӢӨмқҢ мқҙм•јкё°лҠ” м„ұмқҳ лҸҷмӘҪ, лҸҷл¬ё л°–мқ„ мқјм»«лҠ” вҖҳлҸҷмҷёвҖҷлқјлҠ” кіімңјлЎң мқҙм–ҙ진лӢӨ.В В (кёҖ_мқҙлӘ…нӣҲ. 2021.11.)вҖӢвҖӢ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