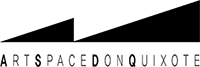공터에서 세 번째 이야기
제주 오라동 ‘하간’ 이야기 : 장소와 공간 사이  제주 오라동 정실마을 도노미당(본향당) 일시: 10월 8일(화), 저녁 7시 장소: 예술공간돈키호테(금곡길 33, 2층) 이야기 손님: 고영자(미학자, 번역가, 제주기록문화연구소-하간 소장) “공터에서” 세번 째 자리에는 제주도를 초대했다. 더 자세히는 제주시 오라동의 이야기다. ‘순천시사 발간’과 ‘도서관’에 이어 왜 갑자기 제주도로 튀었을까? 지난 두 차례의 이야기 자리에서 공통되게 순천 지역 자료의 수집, 관리와 보관, 활용에 대해 아쉬워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지난 몇 년간 순천에서 기록과 아카이브의 중요성을 피력하는 말들이 많아지기도 했고, 조사와 연구를 지속할 수 있는 지역학연구소 설립에 대한 요구가 있어온 것도 사실이지만, 소수의 몇몇 연구자들에 의해 불안정하게 공유되고 있을 뿐이다. 기록과 아카이브의 모호한 개념어 소비보다는 ‘방법으로서’의 다양한 실천들이 제시되어야 하고, 지역학연구소 설립이 아직 요원하다면 지방자치단체는 일반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통합기록-공공플랫폼을 우선 구축해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순천의 옛 자료를 찾다보면 제주 관련 내용이 간혹 연결지어 등장한다. 한때 제주가 전라남도 행정구역에 묶여 있어서 같은 범주에 기록되곤 했던 것이다. 작년 12월 제주시우당도서관은 『1930년 전라남도사정지·제주도 편』을 번역 출간했다. 전라남도에 대한 주요 정보를 담고 있는 『전라남도사정지』(소메카와 가쿠타로, 1931)는 이번 제주도 번역 편이 처음이다. 지역 공공도서관이 긴 시간 동안 지역 관련 문헌 번역사업(1993~, 총 37권 발간)을 수행하고 있는 것도 드문 사례다. 번역된 책을 살펴보던 중 의외의 관심이 번역자와 그가 몸담고 있는 연구소로 향했다. 민간 연구소인 ‘제주기록문화연구소-하간’은 2017년 언어학자, 역사학자, 민속학자, 미학자, 예술가, 출판인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설립되었다. ‘하간’은 ‘여러 가지, 다양한, 풍부한’을 뜻하는 제주어로, “제주 여기저기에 다양한 형태로 산재한 기록문화에 다각적·다층적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연구소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 ‘하간’의 주요 연구활동을 보면, ‘제주해녀’에 관한 다층적인 기록·번역·전시·편집·발간, 근대기 제주역사문화자료 수집·연구, ‘4.3종교계’ 진상조사, 국보와 문화재 지정 연구보고서 제작 등을 수행했다. 이번 순천에서는 ‘하간’의 지역내 다양한 공동체 조직과의 유기적 협력에 기반한 방법론과 주 활동 무대인 제주시 오라동에서의 ‘하간’ 실천들을 들어보고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자 한다.
** 별안간 열리는 공터에 초대합니다. 이야기 주제에 관심있는 누구나 참석 가능 소개 고영자는 미학자이자 번역가로, 제주기록문화연구소-하간 소장이자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과 재일제주인센터 특별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일본근대사상(서사이론), 동시대예술론, 문화매체론, 제주미학(이미지 변천사), 제주 문화자원 기록화(제주해녀, 제주신당, 방사탑, 돌하르방, 하천과 교량 등) 방면으로 연구 활동을 하는 한편, 개화기~근대기 외국어(영·불·일)로 된 제주기록물 발굴 및 번역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제주 관련 번역서로 『제주 땅에 새겨진 신유가사상의 자취』(데이비드 네메스, 2012), 『(서양인들이 남긴) 제주견문록 : 1845~1926』(2013), 『(서양인들이 남긴) 제주도 항해·탐사기 : 1787~1936』(2014), 『구한말 佛語·英語 문헌 속 제주도 : 1893~1913』(2015), 『新제주순력담 : 1973~1974』(데이비드 네메스, 2016), 『제주도 : 삼다의 통곡사』》(韓東亀 편저, 2017), 『구한말 제주도일반현황』》(神谷卓男, 2022), 『1930년 전라남도사정지·제주도편』(染川覺太郞, 2023) 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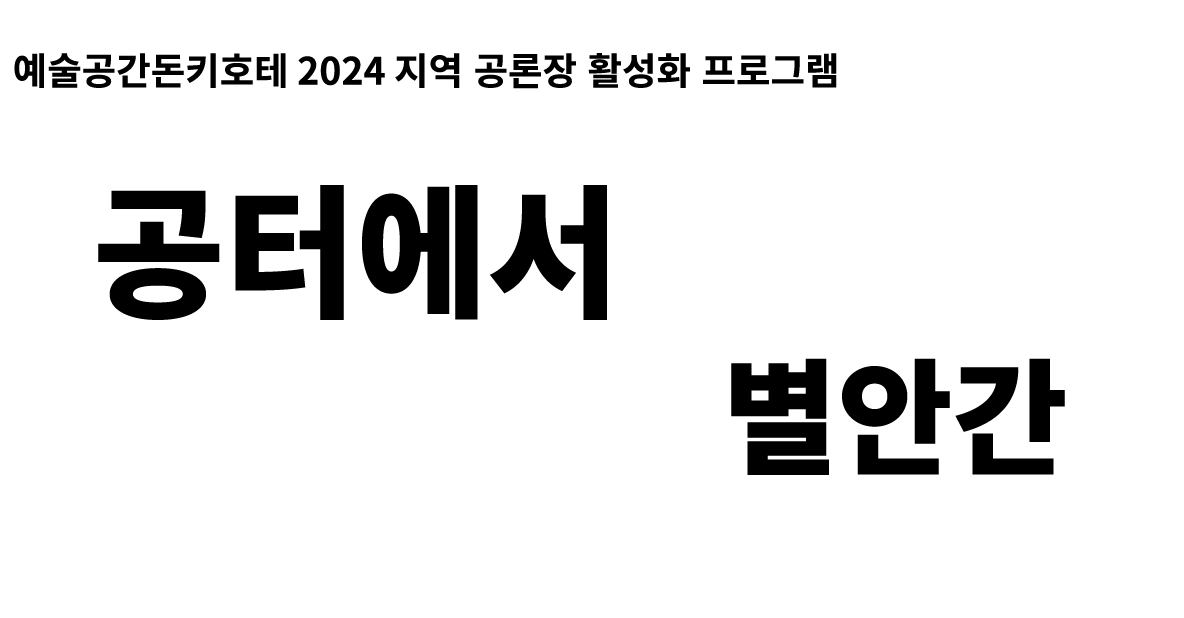
*** 이 프로그램은 예술공간돈키호테가 2019년 시도했던 <굿이브닝예술포럼>과 <순천도큐멘타>에 이어 올해부터 다시 만들어가는 지역 공론장 활성화 프로젝트입니다. 앞의 두 프로젝트가 지역에서의 문화예술 활동과 도시 기록 활동에 관한 일시적 지역 아카이빙과 연구 중심의 성격을 띠었다면, 이번 <공터에서 별안간>은 나와 모두의 삶의 터전과 환경, 문화사회적 생태계로서 지역이라는 조건에서 실천적 의제들을 발굴하고 공통의 관심사로서 해당 의제에 대해 지속적이면서 실험적인 지역 연계 활동으로 확장해 가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