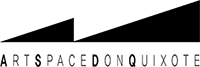|
[그림1] 1872년 지방도 중앙동 부분(서울대 규장각 소장)
[지역연구-순천 중앙동편(2)] 성의 동쪽, 사라진 정원
100년 전, 200년 전 중앙동의 모습은 어땠을까? [그림1]은 고종 9년(1872) 무렵에 그려진 순천 지도이다. 과거 중앙동 일대를 살펴볼 수 있다. 온전해 보이는 성벽과 성문, 건물과 길(붉은 선)이 또렷하게 표현되어 있다. 옥천을 경계로 북쪽은 소안면(蘇安面), 남쪽은 장평면(長平面)이었다. 소안면은 13개 동으로 이뤄져 있었다. 중앙동은 그 일부였다. 법정동인 중앙동(동내와 북내)의 자리에는 객사(客舍)와 객사의 문루였던 관풍루(觀風樓), 지방자치 기구라 할 수 있는 향청(鄕廳)과 무기를 보관했던 군기(軍器) 네 개의 건물이 보인다. 그 아래 남내에는 군부대였던 전영(前營)과 감옥(獄), 영장청(營將廳), 창고인 사창(社倉)과 진창(賑倉)의 건물이 그려져 있다. 이제 성안을 벗어나 동문 밖, 동외 지역을 살펴보자. 사정(射丁)과 사마(司馬), 두 개의 촌락과 동천변에 환선정(喚仙亭)과 우선정(遇仙亭), 그리고 배 한 척과 함께 동천을 건너는 다리 광진교(廣津橋)가 그려져 있다. 그리고 동천과 옥천이 합수되는 곳을 이수합(二水合)으로 표기하고 있다.
동외 사정(射丁)과 사마(司馬)
사정(射丁)은 '활터'로 인근에 환선정이 있어서 붙여진 지명일 것으로 생각된다. 활터는 이곳 외에 하나 더 있었다. 지금의 저전동에 자리한 정충사를 1872년 당시에는 '남사정'으로 이름하여 활터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명에 ‘丁’이 붙은 곳은 순천에서 북정(北丁)과 남정(南丁) 등이 있다. 그렇다면 ‘사마(司馬)’는 어떤 곳이었을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서 ‘사마소(司馬所)’를 조선시대 과거시험 중 소과(小科)인 사마시에 합격한 지방의 생원(生員)과 진사(進士)들이 각 고을에 설립한 자체 협의기구라고 설명하고 있다. 사마시 합격자에게는 성균관에 입학할 자격을 주었고 벼슬을 받을 수 있는 문과(文科)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다. 다른 사전에 의하면 사마는 조선 초 무관직으로 군정을 관리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무관직의 하나였던 사마가 점차 생원·진사를 지칭하게 되었다고 한다. 무과시험은 훈련원이 주관하여 각 지역에서도 초시가 열리기도 하였다. 무과의 시험 종목에는 활쏘기, 말타기, 격구 등이 있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사마가 어떤 장소였을까를 설명하는 두 가지 가설이 가능하다. 첫 번째, 사마는 순천에서 사마시를 치렀던 시험장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는 순천 출신의 생원과 진사들이 모이는 사마소 또는 사마계(司馬契)의 회합의 장소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 사마 지역이 무술을 연마하고 무과 시험을 치렀던 장소였을 가능성이다. 동천과 옥천이 합수되는 이곳은 넓은 백사장이 펼쳐진 곳이었다. 환선정이 건립 초기에 무(武)를 연마하기 위한 강무정(講武亭)이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연관이 없는 것은 아닐 듯하다. 유학 교육의 기초로 육예(六藝)가 있는데, 예(禮)·악(樂)·사(射)·어(御)·서(書)·수(數)이다. 이 가운데 사(射)는 활쏘기, 어(御)는 말타기이므로 사마 지역이 말을 타고 활을 쏘던 곳. 그런 수련장이 아니었을까 라고 생각해 본다.
사라진 신선들의 정원, 환선정
남원에 광한루가 있다면 순천에는 환선정이라고 하는 빼어난 풍광을 가진 원림(정원)이 있었다. ‘환선(喚仙)’이란 신선을 부른다는 의미이다. ‘우선(遇仙)’은 신선을 만난다는 뜻이다. 어떻게 이 같은 이름의 공간이 순천 동천변에 조성되었을까? 지봉 이수광은 순천부사 재임 시절에 쓴 『승평지』에 환선정의 연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처음으로 기록했다.
환선정. 성의 동쪽에 있다. 가정 계모년(1543년)에 부사 심통원이 처음 세우고 만력 정유년(1597년) 뒤 갑인년(1614년)에 부사 유순익이 옛터에 중건하므로 말미암아 대청 뒤에 영선각이 있었는데 누워 쉬는 곳이 되었다. 앞에는 사장(射場)이 있는데 아주 높아 그 정자를 가렸다. 편액에 소강남 및 영선각이라 되어있고 둘 다 배사문 대유가 씀이라고 했다. (이수광, 승평지 중에서)
이수광이 1616년부터 1619년까지 순천부사로 재임했던 점을 생각하면 전임자 유순익이 1614년 무렵에 새로 지어놓은 환선정을 보았을 것이다. 동천의 물을 끌어다 배를 띄울 수 있는 호수를 만들고 정자를 세웠으며 활터로 사용하였다. 환선정은 여러 차례 중수되었으므로 시대별 경관이 조금씩 달랐을 것이다. 1790년 무렵 순천부사 윤광안(尹光顏)의 기록을 통해 환선정과 그 주변의 풍경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자.
동천이 산기슭을 따라 흐르다 환선정의 한쪽 면을 고리 모양으로 둘렀는데, 정자 난간 앞에 이르러 맑고 평평한 못[塘]이 되어 헤엄치는 물고기를 허리 굽혀 셀 수 있었다. 정자 양쪽에는 돌을 쌓아 둑을 만들고 긴 숲과 아름다운 화초를 심었는데, 모두 회화나무, 녹나무, 동백나무, 백일홍 등이었다. 정자 앞에는 돌다리의 큰 길이 있고, 그 중간에 화려하게 장식한 배를 띄우거나 물결 따라 내려갈 수 있었다. 정자 남쪽에는 사장(射場)이 있는데, 말달리고 활쏘기에 합당하였다. 그 서쪽에는 민가들이 에워싸고 농로가 교차하며 뽕나무와 삼이 우거져 있다. 정자에서 배회하며 사방을 바라보니 탁 트이고 선명하며 농담(濃淡)이 각기 알맞아, 유려함과 통창함 둘 다 이른 것이 대체로 이와 같다. (윤광안, 환선정중수기 중에서)
그다음으로는 환선정, 영선각, 우선정과 같이 신선과 관련된 이름이 붙여진 배경에 대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유순익 부사가 중건한 환선정에 대해 동년배인 유몽인이 쓴 <환선정중수기>를 통해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순천부가 산과 바다 사이에 끼어 평소 경관이 수려하다는 칭송이 자자하였으니 저 동명(東溟) 방장산(方丈山)의 여러 신선이 지나가다 이곳에서 유식(遊息)하며 세속에 섞여 있어도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이겠는가. 나는 여중 씨(유순익 부사)가 반드시 신선이 누각을 좋아한다는 것을 듣고서 객관(客館)으로 지은 것임을 알겠으나, 여중 씨가 어떤 방법으로 신선을 불렀는지는 알지 못할 뿐이다. (유몽인, 환선정중수기 중에서)
유몽인의 설명에 따르면, 순천이 신선들이 지나가는 길목에 자리 잡고 있고 경관이 수려해 신선들이 쉬어갈 만한 곳이기 때문에, 그들이 누각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객관(환선정)을 지은 것임을 알겠다는 이야기다. 다만 신선을 어떻게 불렀는지 알지 못한다고 적고 있다. 예부터 산이 많은 우리나라에도 신선들이 모여 산다고 믿었다. 대표적인 산이 동해의 금강산(봉래산), 지리산(방장산), 한라산(영주산)이다. 이 세 산을 삼신산(三神山)으로 추앙하였다. 그런데 이 세 산을 연결하는 지점, 특히 한라산과 지리산(방장산)을 연결하는 곳에 순천이 자리한다는 것을 절묘하게 포착해 냈다. 이런 지리적 감각은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 더욱 절묘한 것은 동외 환선정에서 보이는 삼산이다. 삼산은 두 봉우리가 온전하게 솟아있으나 한 봉우리는 잘려나간 듯 평평한 모양새이다. 이런 모양의 순천의 삼산을 바라보며 마치 금강산, 지리산, 한라산을 한꺼번에 옮겨놓은 듯한 묘한 기분을 들게 하였을지도 모를 일이다. 유순익 부사가 “백구 나는 곳에 물은 바람을 일으키네. 봉래(蓬萊) 영주(瀛州) 삼천리가 멀다고 이르지 마소. 군선(群仙)을 불러들여 좌중에 둘러앉혔네”라고 시를 읊었던 것도 이런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순천문화원이 2000년에 발행한 『순천 옛시』 가운데 서병구의 환선정 시에서는 “승평이란 옛 고을에 이 정자가 있고 이수와 삼산이 난간 밖에 푸르네. 만약 가는 신선을 불러 다시 돌아오게 한다면 응당 이 곳이 가장 신령스럽게 되리라”고 읊었다. 어떻게 보면 순천의 역사에서 가장 신령스러운 기운이 감도는 정원이 환선정이었던 것이다.
환선정은 1910년 경술년부터 몇 년간 선암사와 송광사의 포교당으로 사용되었다. 신선을 불렀던 누정에서 불당으로 변하여 '불선(佛仙)'의 거처가 된 것이다. 1920년대부터는 각종 사회단체의 결사와 집회 장소, 귀빈을 맞이하는 만찬회장이 되기도 했고, 농민들을 위한 문고가 설치되었으며 학생들을 위한 임시 학교로 사용되기도 했다. 야외에서는 씨름, 궁술대회 등이 열리기도 했다. 1930년대부터는 홍수 피해로 호수가 매립되어 과거의 신령함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다. 해방 직후에는 승평교회(현 동부교회의 전신)의 예배당으로도 사용되었으니 부처에 이어 예수의 거처가 되기도 했다. 환선정은 여순사건과 한국전쟁과 같은 병화를 견뎌냈으나, 1962년 순천 대수해로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만다. 현재 환선정 자리에 모텔이 자리하고 있다. 그리고 1988년에 죽도봉 공원 활터 뒤에 새로운 모습으로 복원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다만 찾는 이가 거의 없는 정자로 쓸쓸하게 남아 있을 따름이다.
(글_이명훈 202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