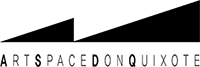|
[지역연구] 순천 바람의 기록
문화 이전의 문화
“문화란 문화예술, 생활양식, 공동체적 삶의 방식, 가치 체계, 전통 및 신념 등을 포함하는 사회나 사회 구성원의 고유한 정신적‧물질적‧지적‧감성적 특성의 총체를 말한다.”
이것은 2016년 제정된 「문화기본법」에서 ‘문화’라는 용어를 정의한 것이다. 「문화기본법」에서는 문화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사회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의 가치와 위상을 높여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과거에는 어땠을까? 과연 고려나 조선 시대에도 이런 생각이 없었을까? 백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문화’의 개념이 없었을까? 서양의 문화 개념이 들어오기 이전, 즉 근대 이전의 문화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오늘날 ‘문화’의 의미에 해당하는 개념어가 과거에 무엇이었는지를 살펴야 한다. 우선, 한자문화권에서 서양의 컬처(Culture) 개념을 '문치교화(文治敎化)'로 이해하고 ‘문화’라는 두 글자의 조합으로 번역했음을 주목해보자. 문치(文治)는 무치(武治)와 구별되는 것으로, 무력보다는 말과 글로 통치한다는 것을 말한다. 교화(敎化)란 잘못을 바로잡아 바르게 바꾼다는 의미로 교정(敎正)이라는 말과 유사하다. 따라서 근대기에 문화인이란 문맹자가 아닌 문자를 읽고 쓸 줄 아는 계몽된 사람이며, 상식이 풍부하고 사교에 필요한 에티켓을 겸비한 교양인을 의미했다. 흔히 문화는 문맹 또는 야만과 구별되었다. '문치교화'의 의미로서 근대적 문화 개념에 가장 가까운 용어는 무엇이었을까?
관풍, 바람을 본다는 것
1367년(공민왕 16) 무렵 유학자이자 문신이었던 이달충은 「전주관풍루기(全州觀風樓記)」를 남겼다. 그는 다음과 같이 ‘풍(風)’의 의미를 설명했다.
풍(風)이라는 것은 소리(聲)이고, 가르침(敎)이며 법(法)이요 고(告)하는 것이다. 대개 그렇기 때문에 위로는 간언하는 것이고 아래로는 교화하는 것[刺上化下]이다.
그는 관풍(觀風)을 통해 나라의 흥망성쇠를 알 수 있다고 하였다. 얼마큼 ‘풍’의 개념을 중요시했는지 알 수 있다. 유교를 풍교(風敎)라고도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것이다. 「문화기본법」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사회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문화를 지목했다면, 이달충은 ‘바람 풍’을 지목하고 있는 셈이다. 풍교(風敎)는 곧 풍화(風化)이다. 이것이 오늘의 문화의 개념에 가장 근접하는 개념이 아닐까? 옛사람들은 자연의 바람을 어떻게 인문적인 것으로 해석했을까? 국어사전에서 풍속(風俗)은 예부터 전해온 습관 따위를 말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풍습(風習)도 비슷한 의미이다. ‘풍류(風流)’라는 말과 비교해서는 풍속은 세속적이며 일반 대중의 생활문화와 관련된 것이라면, 풍류는 신라 화랑의 풍류도(風流道)에서 기원한 것으로 보이는데, 세속에 물들지 않는 고상한 것으로서 지배계층의 문화향유를 풍속과 구별하여 지칭할 때 쓰이기도 한다. 풍속과 풍류라는 두 단어에서 차별적 견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풍속이 세속적인 것으로 단속과 교화의 대상이라면, 풍류는 탈속의 것으로 바람의 흐름에 맡기듯 내버려 두는 듯한 인상을 갖게 된다. 풍속은 근대 문화어의 하나인 ‘민속’이라는 말로 바뀌었고, 풍류 역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세속화되었으며, 특히 음악 분야에서 전유되었다. 고전에서는 ‘풍속’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1554년(명종 9년) 왕명으로 발행된 『경국대전주해(經國大典註解)』에서는 “위에서 행하고, 아래에서 본받는 것을 風이라고 하며, 뭇 사람들의 마음이 안정된 것을 俗이라고 한다(上行下效曰風, 衆心安定曰俗)”라고 하였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말과 일맥상통한다. 그런가 하면 비슷한 시기였던 1590년, 평안도 관찰사 윤두수가 편찬한 『평양지(平壤志)』에서는 “서로 부는 것을 風이라 하고 서로 물드는 것은 俗이라 한다”라고 설명하면서, “풍속이 사람들에게 옮아가는 것을 정치가가 관찰하니 어찌 염려하여 좋은 곳으로 인도하지 않겠는가. 풍속의 변화를 잘 살펴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위정자의 할 일이다”라고 하였다. 위에서 아래로 바람이 분다는 첫 번째 풀이와는 다르게 윤두수는 ‘서로 마주 부는 바람’을 이야기하고 있다. 풍속을 ‘위아래’의 위계적 작용이 아니라 ‘서로’라는 상호작용으로 본 것이다. 일방적이거나 순차적인 것이 아니라 쌍방향적이며 동시적인 것으로 풍속을 이해하였다. 세속(世俗) 또는 속세(俗世)라는 말이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고 풍속을 함축한다는 의미에서 속(俗)은 곧 습(習), 물에 젖는 것, 물드는 것이다. 속세란 일상의 활동, 의식주와 가치관 등 생활양식이 관습화된 곳이다. 그러나 새로운 바람이 불어 사람들에게 옮아가고 물드는 등의 유행을 타게 되면 풍속이 변한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것과 같다. 사실상 이것이 문화의 속성이기도 하다. 문화란 서로 부는 것이고, 물드는 것이다.
윤두수는 이러한 풍속의 변화를 잘 살펴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위정자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은 「문화기본법」에서 문화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언급하고 있는 것과 유사하다. 사실상 조선시대에 왕명으로 파견된 지방관들의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는 각 지방의 풍속을 잘 살펴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었다. 최고 권력자인 왕 또한 임명권자로서 그 책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또한, 임금의 덕(德)이 온 나라에, 백성들에게 널리 퍼져나가는 것을 덕화(德化) 또는 광화(光化)라 하였고, 왕명을 받은 관찰사와 지방관들이 각 고을에 파견되어 그 지역의 풍속을 세심하게 관찰하여 바로 잡는 것을 선화(宣化)와 풍화(風化)라 한 것이다. 이 명칭은 조선시대 누정(樓亭)의 이름으로 전해져 오고 있다. 서울의 광화문을 비롯해 선화정과 선화루, 관풍루와 풍화루 등이 전국 지역에 산재해 있다.
고려시대에 도입되어 조선시대를 지배한 통치 이념이었던 유학은 글자-문(文)을 매개로 인간됨의 본성을 밝히고 이를 통해 일반의 풍속을 교화해 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통치의 맥락에서 '미풍양속'을 권장하고 그 모범들을 제시하는, 일련의 '교화'를 목적으로 풍속을 단속하는 것을 '풍화'의 의미로 정리할 수 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친 조선 중후반에 충신, 효부, 효자, 열녀에 관한 미담이 꾸준히 발굴된 것이나 그에 대한 기념사업(사우와 정려의 설치)이 전국 각지에서 경쟁적으로 활발했던 것을 유교적 '문화정치'의 한 단면이라고 볼 수 있다.
순천, 바람의 기록
1881년 순천 부사 김윤식은 『순천속지』의 서문에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다만 풍속과 교화가 바뀌고 제도가 시대에 따라 변경되니 인물의 성쇠(盛衰)와 누각과 정자의 변화도 옛날과 지금이 매우 달라 몇 해만 더 지나도 장차 근거할 바가 없게 될 듯하다. 읍인이 이를 염려하여 속지(續誌)의 간행을 청했으나 내가 자꾸 미루다가 이제야 양사재(養士齋)에 간행처를 열어 읍의 유림 중에서 선발하여 이 일을 돕게 했다.
지역 사정을 잘 모르는 중앙 관료가 지방관으로 부임하여 지역을 잘 통치하고 경영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연혁과 풍속, 산천 지형은 물론 토산물과 관방시설 등 그 지역 자산과 잠재적 자원을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따라서 예부터 전해 내려오는 읍지(邑誌) 또는 지리지(地理誌)를 중요하게 여겼다. 지역의 토호세력 역시 새로운 지방관의 선정(善政)을 바라고 지역의 자산을 잘 운용하여 지역의 가치를 드높이는 것이 곧 자신들의 이익과 부합하므로 읍지나 향안(鄕案)과 같은 공공기록물의 편찬에 신경을 썼을 것이 분명하다.
조선시대 읍지나 지리지 등에 수록된 조항 가운데는 오늘의 문화와 예술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다. 풍속(風俗)을 비롯하여 당시 문화시설이라 할 수 있는 누정(樓亭), 교육시설인 학교(學校), 종교시설이자 오늘날 많은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는 사찰(寺刹), 사묘(祠廟), 고적(古跡), 오늘의 공방(스튜디오)에 해당하는 공장(工匠), 역대 문학작품과 출판에 해당하는 제영(題詠)과 잡저(雜著) 등의 기록이 그것이다.
그중에 풍속의 기록을 살펴보자.
尙富麗。地志。 풍성하고 화려한 것을 숭상한다. 지지(地志). (『신증동국여지승람』, 순천부 풍속, 1530)
尙富麗(出地志) 喜巫祀 士習淳厚無詭異矯激之事 풍부하고 화려함을 숭상한다.(출처 지지) 무사(巫祀)를 즐긴다. 선비의 습속(習俗)은 순후해 괴이(詭異, 怪異)하고 교격(矯激)한 일이 없다. (이수광, 『승평지』 풍속, 1618)
여지승람의 기록이 어떤 지지(地志)를 참조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순천의 풍속을 “숭부려(尙富麗)”라고 적었다. 여기에 지봉 이수광은 “무사(巫祀)를 즐기나 고을 선비들은 온순하고 인정이 두터워 괴이하거나 과격한 일이 없다”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지봉은 순천의 어떤 모습을 본 것일까? 지봉의 기록은 『승평지』 이후로 1729년 발간 『중간승평지』, 1881년 발간 『신증승평지』, 1923년 발간 『승평속지』에 이르기까지 약 300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변함이 없다. 그 긴 시간 동안 순천의 풍속이 변함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부와 화려함을 숭상하고 무사를 즐겼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예부터 순천에는 부자가 많았던 모양이다. 부자들이 화려함을 뽐내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숭부려(尙富麗)’를 순천의 풍부한 물산과 빼어난 자연경관으로 해석하는 예도 있다. 그런 조건과 환경이 순천의 풍속을 그렇게 만들었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조선의 풍속이 사치하지 않는 검소함과 꾸밈없는 소박함을 강조하고 단순함을 추구했던 것을 생각해보면, 부와 화려함을 숭상하는 풍속은 조선다운 것이기보다는 고려의 풍속에 가깝다. 순천의 풍속을 이렇게 적어놓은 것은 자랑이기보다는 어떤 경계의 표현일 것이다. 특히 굿(무사巫祀)을 즐긴다는 표현에서는 더욱 그렇다. 유학자에게 굿은 권장할만한 미풍양속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순천에 부임한 수령들에게 순천의 풍속이 이러하니 잘 살피어 교화해야 한다는 전언을 읍지에 남겨둔 것으로도 풀이할 수 있다. 조선 초 왕명을 받아 해당 관청에서 편찬한 역대 지리지 가운데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은 전국 군현 지리지의 종합으로서 후대 각 읍지와 지리지의 편찬에 있어 중요한 모본이 되었다. 1616년 10월부터 1619년 3월까지 순천부사로 재임했던 지봉 이수광이 1618년에 편찬한 『승평지(昇平志)』 역시 『동국여지승람』을 본보기로 삼았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다. 여지승람의 서문에서도 “풍속은 한 고을을 유지시키는 바(風俗所以維持一縣)”라고 하였다. 한 고을을 유지시킨다는 것은 곧 질서의 유지를 말한다. 『경국대전주해』에서 말했던 바와 같이, “뭇 사람들의 마음이 안정된 상태”를 말한다. 그러므로 지방관은 그 지역의 풍속을 잘 관찰하고 계도(啓導)하는 것이 중요한 소임이었다. 1519년(중종 14) 황해도 관찰사 김정국은 도민의 교화를 위해 한글로 풀어쓴 『정속언해(正俗諺解)』를 편찬하면서 “백성을 계도하여 풍속을 교화케 할 도리에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쏟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못 이 책을 만든 뜻이 아니니 무릇 우리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은 대부분이 또한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다(其於導民化俗之道 若不盡心而致誠焉 則殊非編者之意 凡我牧民者 尙亦念哉)”라고 하였다.
21세기 지금 순천의 풍속, 문화를 어떻게 기록할 수 있을까? 과거 읍지를 살펴보면서, ‘숭부려(尙富麗)’의 기록이 지금의 순천 문화에도 유효한 것이 아닐까? 부를 숭상하고 화려함을 뽐내는 문화는 자본주의 시대에서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런 현상이 어디 순천뿐이겠는가.
여전히 순천은 전남 동부권의 인적, 물적 집산지로서 문화 자원이 풍부하고 수많은 크고 작은 축제와 문화예술 이벤트들이 매년 벌어지고 있으니 옛 기록을 바꾸지 않아도 이상할 것이 없다. 다만, 1990년대 중후반부터 순천은 순천만의 생태적 가치를 재발견하면서 ‘생태수도’ 또는 ‘생태도시’의 이미지가 창출되었고, 2013년 국제정원박람회 개최 이후로는 ‘정원도시’의 이미지가 부각되면서, 문화를 보다 생태적인 것으로 변화시키고 있음을 추가해 둘 필요가 있겠다. 무엇보다 자연을 지배적 관점이 아닌 공생의 관점으로 바꾸고, 생태계의 종 다양성과 다변화, 순환이 가져다주는 풍요로움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20세기를 지배했던 근대적 문명관을 성찰하면서 서구 자본주의 중심의 기존 문화를 생태문화로 대전환시키는 것. 이것을 21세기 순천의 바람으로 기록할 수 있을 것이다.
* ⓒ 예술공간돈키호테 이명훈 * 이 글은 2020년 12월 순천문화원이 발행한 단행본 <순천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살피다>에 실린 원고의 부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