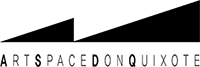|
공터에서 일곱 번째 이야기 고인돌의 세계, 전남동부지역 이야기 고고학 
순천 서면 운평리 지석묘와 무덤방 (사진출처: 순천시사편찬위원회, 순천시사 8권 문화유산, 2024)
일시: 12월 3일(화) 저녁 7시
장소: 예술공간돈키호테(순천시 금곡길33, 2층) 이야기 손님: 박성배(순천대학교박물관 학예연구사) 공공미술 또는 공공예술의 기원을 추적하다 보면 그것 역시 인류 문명과 함께 기원하여 발전했음을 알게 된다. 국가의 탄생 이전에 공동체의 삶이 오랜 기간 이어져왔고, 그 집단을 이끄는 우두머리의 등·퇴장도 계속되었다. 특히 죽음에 대한 의례와 무덤의 건축은 원시 선사시대나 지금의 고도화된 현대문명을 누리고 살고 있는 인류 모두에게 공통된 과제라 할 수 있다. 무덤이라는 용어는 ‘묻다’ 또는 ‘묻고 덮다’라는 동사의 명사형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인류는 언제부터 죽은 자의 신체를 땅 속에 묻고 돌이나 흙으로 덮는 ‘무덤’이라는 건축적 행위를 시작했을까? 고인돌은 선사 고대인의 돌무덤이면서 그 무덤의 위치를 나타내는 표식으로서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난 현재까지도 비교적 그 원형을 유지하면서 남아있다. 그런데 전 세계에 널리 분포한다는 고인돌이 어떻게 한반도, 그것도 전남 지역에 상당수가 밀집해 있는 것일까? 순천을 포함해 전남 동부 지역에서 고인돌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얼마 전 고흥분청문화박물관에 갔다가 고흥 지역이 “고인돌 최대 밀집 지역”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고흥 보다 더 많은 수의 고인돌이 분포하는 지역이 '여수'라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또 한 번 놀랐다. 왜죠? 우리는 이 고고학적 사실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할까? 그냥 바윗돌인지 고인돌인지 멀리서 보아서는 분간하기 어렵지만, 가까이 다가가 아래 부분을 살펴보면 고인돌이 분명한 것을 몇 번 찾아 낸 적이 있다. 설명판 하나 없는 것으로 보아 지금까지 발굴조사가 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지금까지 도로를 내거나 확장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택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건물을 짓기 위해 터를 닦는 과정에서, 댐 건설로 수몰 지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고인돌의 존재가 확인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것의 일부는 발굴 조사를 거쳐 공원이나 박물관 등으로 이전되기도 했지만, 파손되고 물에 잠긴 것도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어떤 고인돌 발굴에서는 신석기, 청동기 등 각종 부장품까지 발굴되기도 했다. 사람만 묻은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예술도 함께 묻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예술공간돈키호테가 ‘공터에서 별안간’ 고인돌을 주목한 이유가 공공예술의 고고학적 발굴에도 있지만, 이 자리를 빌려 지역을 고고학의 관점에서 조망해보고 발굴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 유적발굴로 인한 보존과 개발 논리 간의 쟁점 등을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한다. 박성배(고고학, 학예연구사) 순천대 사학과, 경상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재)대한문화재연구원에서 6년 근무했으며, 현재 국립순천대학교 박물관 학예연구사로 재직하고 있다. 그동안 순천 조례동 신월 고인돌 유적 외 50개소의 고고유적 발굴조사에 참여했다. 대표논문으로 「호남동부지역 가야토기의 유입과 변천」,「문자기와로 본 순천 봉화산성의 성격」,「장수 삼고리고분군 출토 토기의 변천양상과 그 의미」 등이 있다. ** 별안간 열리는 공터에 초대합니다. 이야기 주제에 관심있는 누구나 참석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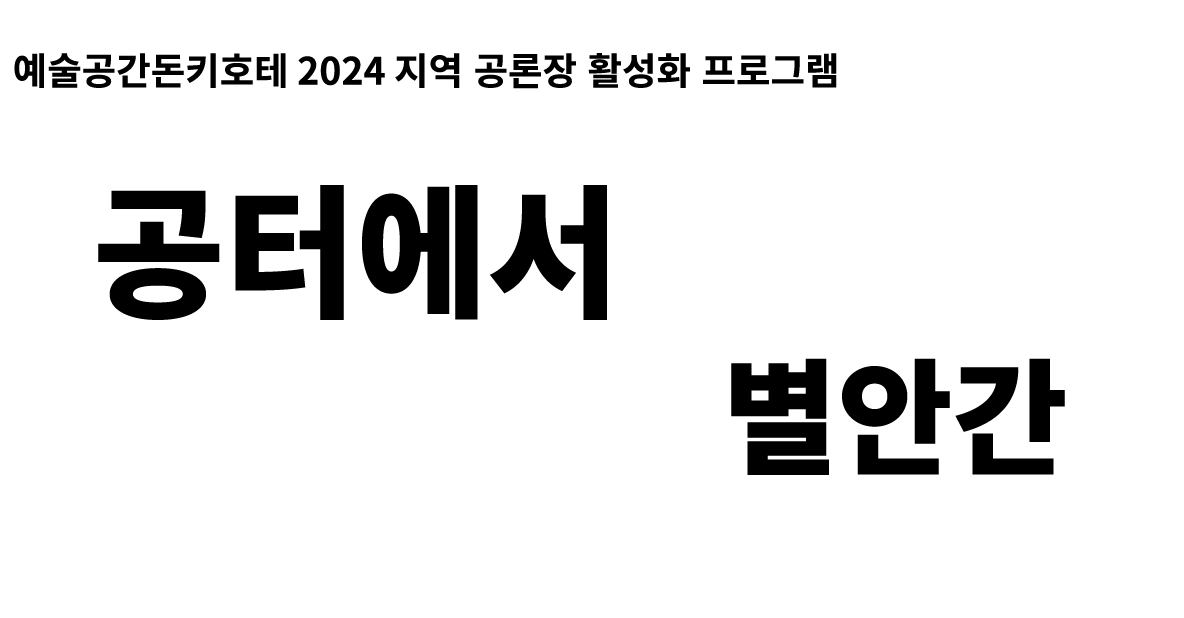
*** 이 프로그램은 예술공간돈키호테가 2019년 시도했던 <굿이브닝예술포럼>과 <순천도큐멘타>에 이어 올해부터 다시 만들어가는 지역 공론장 활성화 프로젝트입니다. 앞의 두 프로젝트가 지역에서의 문화예술 활동과 도시 기록 활동에 관한 일시적 지역 아카이빙과 연구 중심의 성격을 띠었다면, 이번 <공터에서 별안간>은 나와 모두의 삶의 터전과 환경, 문화사회적 생태계로서 지역이라는 조건에서 실천적 의제들을 발굴하고 공통의 관심사로서 해당 의제에 대해 지속적이면서 실험적인 지역 연계 활동으로 확장해 가고자 합니다. |